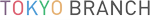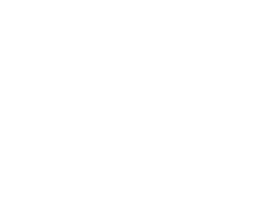닌텐도는 정말로 스마트폰 때문에 위기를 맞았을까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게임 제국 ‘닌텐도’ 이야기 – by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에서 닌텐도의 위기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많이 공유가 되더군요. 저는 기사를 읽고, 공감할 수 없는 점이 많았습니다. 기사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분석한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닌텐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 관련 미디어는 물론이고 경제지나 일반 신문에서도 한마디씩 닌텐도의 위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팩트처럼 거론되는 몇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닌텐도는 위기를 맞았다.
・딱딱한 회사 분위기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로 막는다.
・주가가 폭락해서 위기다.
・빨리 변화한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
이런식인데요. 아웃스탠딩의 기사에서도 위의 이야기는 팩트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저 이슈들은 실제로는 닌텐도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며, 심지어 팩트와도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을까?
닌텐도의 게임 플랫폼은 크게 휴대용과 거치용으로 나뉘어집니다. 거치용은 패미콤→슈퍼패미콤→N64→게임큐브→Wii→Wii U로 이어지는 가정용 게임기 플랫폼입니다. 휴대용은 게임보이→게임보이컬러→GBA→NDS→3DS로 이어지는 플랫폼입니다.
닌텐도의 최신 휴대용 플랫폼인 3DS는 2015년 4분기에만 일본 국내에서 118만대, 북미에서 123만대, 그 외의 국가에서 118만대를 팔았습니다. 합치면 2015년 4분기에만 359만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3D 기능을 뺀 염가판인 2DS가 2015년에 북미에서 40만대, 그 외 지역에서 51만대를 판매해서 91만대나 판매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3DS가 753만대, 2DS를 합쳐서 약 844만대의 휴대용 게임기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3DS의 최전성기였던 2011년의 1,506만대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2014년의 757만대와 비교하면 별 변동이 없는 수치입니다. 연말 판매가 부진했지만,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서 1년 내내 꾸준히 3DS가 잘 팔렸습니다. 출시 6년이 지난 게임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3DS가 매년 1500만대 가까이 판매되던 2011~2013년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iPhone과 안드로이드가 보급되고,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이미 콘솔 시장을 넘어선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닌텐도의 콘솔 수명이 평균 7년입니다. 그러니까 3DS의 판매량이 떨어진 것은 콘솔의 수명이 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지, 스마트폰에 밀려서라는 분석은 콘솔 게임 시장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분석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여전히 3DS 게임들은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닌텐도의 실적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치용 게임기 시장에서의 참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ii의 대성공과는 대조적으로 Wii U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Wii U가 망한 이유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뒤떨어지는 성능, 잘못된 컨셉, 시대를 역행하는 플랫폼 운영 등… 결국 거치용 게임기 시장의 주도권을 소니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Wii U가 망한 것은 거치용 게임기 시장이고,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Wii U의 경쟁 상대는 거실 TV에서 구동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애플TV, IP TV 같은 것들입니다. 거실의 TV 환경이 점차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하는 라이브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데, 닌텐도는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경쟁에 완전히 밀려버린 것입니다. 게임기의 컨셉도 문제가 있고 게임 소프트웨어 공급도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컨텐츠 공급이나 배포 방식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실의 경쟁자들이 대부분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소니)거나 미디어 플랫폼(도코모, au, 마소, 넷플릭스, 후루 등)인 것에 비해서 닌텐도는 본질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장난감 회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지만 닌텐도는 소니나 도코모 같은 곳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조직이 작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만 승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컨텐츠의 영역을 넓게 잡으면 당연히 승부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닌텐도라는 기업의 형태를 180도 바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닌텐도로서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ii U의 다음도 어떻게든 게임+장난감의 영역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닌텐도의 위기와 스마트폰의 보급은 언론이나 수많은 칼럼니스트들이 떠들어 대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는 있겠지만, 스마트폰 엔터테인먼트의 영역과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가 영유하는 영역은 생각보다는 교집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딱한 회사 분위기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로 막을까?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의 컨슈머 게임 개발사 중 가장 빠르게 적응한 곳이 어딜까요? 모바일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경이로운 성적을 내고 있는 곳이 바로 코나미입니다. 그런데 코나미야말로 딱딱한 회사 분위기의 전형인 곳입니다. 퇴사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Like 눌렀다고 직원을 징계할 정도로 꽉 막힌 곳이죠. 그런데도 스마트폰에 잘 적응해서 참신한 게임들을 잘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규모가 큰 회사는 어떤 곳을 가도 회사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게임 개발사인데 양복 입고 출근해야 하는 회사도 있고, 지각하면 중징계 받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경영진이 꽉 막힌 것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딱딱한 회사 분위기는 그냥 일본 회사들의 평균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이라서 딱히 닌텐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도 닌텐도의 미야모토 시게루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초월적인 권력을 가진 프로듀서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아래에서도 창의적인 게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양 회사들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딱딱한 분위기가 닌텐도를 위기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위기일까?
한국에서는 유난히 시총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형태나 업종에 따라서는 시총이 회사 경영이나 실적과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닌텐도의 주가는 NDS와 Wii의 성과로 2007~2008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2008년 9월부터 주가가 폭락한 뒤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2008년 9월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닛케이 지수도 이때 폭락하면서 2011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닌텐도도 이러한 주식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동반해서 주가가 폭락했고, 이때 떨어진 주가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닌텐도는 3DS의 판매가 호조였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때는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2013년부터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들의 주가가 수 십 배씩 폭등하는 호황이 찾아왔는데, 닌텐도도 이 시기에 주가가 소폭 상승합니다. 2015년에 또 한번 게임주의 붐이 찾아오는데, 이때 닌텐도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리먼 사태의 영향이 너무 커서 2008년 수준으로는 못 돌아가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닌텐도의 주가가 2008년의 정점에서 폭락하게 된 것은 닌텐도의 실적보다는 리먼 사태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빨리 변화한 시장에 적응해야 할까?
닌텐도의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닌텐도의 시총은 현재 약 2조2,369억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닌텐도의 자산규모는 1조5천억엔 수준에 불과합니다. 닌텐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니는 시총이 3조5,754억엔 정도인데, 소니 그룹의 자산규모는 닌텐도의 10배가 넘은 16조엔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닌텐도는 엄청난 액수의 시가총액에 가려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기업의 덩치가 매우 작습니다. 자산 규모도, 조직의 덩치도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라이벌 기업들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닌텐도의 사원은 2,066명, 해외 지사와 산하에 있는 개발사들을 모두 합쳐도 5,064명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카도카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 소니 주식회사 단독으로만 12,300명에 자회사를 모두 합치면 13만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가전부터 보험업까지 손대는 기업과 비교하는게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닌텐도가 조직의 덩치로는 라이벌들과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서 닌텐도가 추구하는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게임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특화된 운영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게임기라는 장난감을 파는 회사이고, 이 정체성을 벗어나기는 역사, 조직, 경영진 모두에게 무리가 있습니다.
닌텐도에게 자사의 IP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앱에 주력하라는 것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앞으로 자신들의 메뉴를 살린 레토르토 식품 판매에만 주력하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닌텐도에게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것이지, 주력 사업으로 변화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크게 붐이 일어서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노력과는 관계 없이 무조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게임도 기호품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커피숍이나 패밀리레스토랑 비즈니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점이 크게 인기여서 잔뜩 생겼다가 인기가 식어서 많은 곳이 문을 닫고, 그러다가 또 다시 붐이 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게임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주도권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텐센트 같은 기업이 콘슈머 게임기를 만들지는 않겠죠.
닌텐도가 지금 큰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Wii U의 실패로 인해서 거실 타임을 다른 경쟁자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고, 3DS는 이제 하드웨어의 수명이 다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닌텐도 하드웨어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컨텐츠 판매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닌텐도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변화 시킬 것인지는 닌텐도의 몫이겠죠.